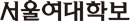1장 한 줄 요약: 사라진 부모님을 찾던 와중, 옛날에 살던 골목의 한 옷 가게에서 엄마의 익숙하고도 독특한 향수냄새가 난다.
"기억나는 게 있어?”
“그럼, 있지. 왜, 없을 거 같아?”
“너는 잘 잊으니까.”
“기억이 좀 산발적이고, 기억해내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야.”
“그래, 알았어. 그래서? 말해봐.”
“초여름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
“같아?”
“아, 좀.”
“알았어.”
이상하게 그날을 떠올리면 내가 스무 살로부터 늙은 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든다. 많은 게 처음이었던 그날. 사실 아무 날도 아니다. 그날이라고 말하는 건 그날 날짜는 몰라서 그렇다. 임의로 24일이라고 하겠다. 24일 일요일, 나름 스무 살이 됐다고 새로 사놓았던 옷으로만 입고 나갔었다. 진 파랑의 반소매 셔츠 안에 흰옷을 받쳐입고 크림색 바지를 입었다. 지금은 안 신는 베이지색 운동화를 신고 편의점 우산 중 하나를 챙겨 나갔다. 지금보다도 집에서 말이 없었던 나는 눈치를 보다가 어디 가냐는 질문을 피하고 싶어 다들 분주할 때 문밖으로 나갔다. 어른들이 싫어할 만한 곳을 가는 건 아니었다.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건 더더욱 아니었다. 다만 혼자 놀러 나간다는 게 희한하게 보일 것 같았다. 나도 그게 처음이었고 무서웠으니까. 엄마는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다. 거기다가 아빠까지 집에 있었는데 나는 그렇게 금방 이해받을 자신이 없었다.
그렇게 집을 나서서 향한 곳은 서촌이었다. 사실 도착하고 나서야 거기가 어딘지 알게 되었다. 어릴 적부터 살았던 동네를 벗어나 본 적이 없던 나는 종로에 가는 일이 너무나 큰 일이었다. 한 시간 정도가 걸리면 너무 먼 곳이었다. 큰맘 먹고 가야 하는 곳. 혼자 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처럼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다. 지하철을 잘못 타기라도 할까 봐 지도에서 눈을 못 떼고 내릴 역을 지나치기라도 할까 봐 내내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그렇게 힘겹지만 순조롭게 도착해 들어선 서촌의 첫인상을 아직도 기억한다. 나를 더 굳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경찰이 보도의 3분의 1 정도를 메우고 있고 버스 크기의 경찰차가 여러 대 있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 걸어갔다. 이번에도 오직 길 찾기에 매진하며 목적지로 향했다. 같은 도시에 있으면서 그렇게 다른 분위기일 수 있을까 싶었다. 내 동네에는 서촌의 느낌이 없었다. 폭이 좁거나 넓은 골목이 곳곳에 나 있고 그 길은 소란스럽지 않은정겨움을 머금고 있었다. 내가 향한 곳은 골목 제일 안쪽에 있던 서점이었다. 나는 낮은 벽돌 위에 잠시 앉아 기다렸다. 그렇게 덥지는 않았다.
그곳에서 맞는 여름은 처음이었지. 저녁이 되어도 비는 계속 내렸다. 종로에서도 비 올 때의 냄새는 우리 동네의 것과 같았다. 회색이 된 하늘을 배경으로 중심엔 큰 사거리가, 그 주변엔 굵직굵직한 건물이 있었다. 그 광경이 한눈에 들어찼다가도 한곳에 머물고 있으면 더 먼 곳을 내다보고 싶어졌다. 건널목을 같이 건너는 사람들에서 시작해 두 블록은 더 가야 있는 건물에 시선을 두고 초조하게 골목을 따라 걸으면서는 비가 빨아들인 노을의 색을 못 본 것에 아쉬워했다. 안경을 쓰고 무릎까지 오는 검은 외투를 입고 있는 직장인, 넉넉한 청바지를 입은 청년을 보고도 모두 치밀한 우연이 모여있는 느낌이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종로가 나와 맞닿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낯설고 어설픈 스무 살의 장면에 빗소리가 더해지니 나는 종로를 완벽하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하루를 내 추억의 단위로 삼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도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 여름날, 아무 날도 아닌 일요일, 어쩌면 24일이었을 그날이 가장 먼저 떠오를 줄은 몰랐다. 그렇게 나는 외국의 어느 거리를 다녀온 여행객의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러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빗소리를 뚫고 어느 여자의 부푼 젊음이 날아드는 걸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