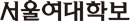최근 교육부가 무전공제의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지원금을 내걸고 대학에 동조를 부추기고 있다.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지원금을 연계하는 방식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지원금을 미끼로 새로운 정책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재정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대학가에 인센티브를 줄 테니 신입생 선발 방식을 바꾸라고 말하는 교육부의 행태는 강요나 다름없다.
무전공제는 전공을 선택하지 않고 입학한 학생들이 다양한 강의를 들은 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에 대학 정원의 25%가량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교육부가 제시한 목표 비율을 달성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는 대목이었다. 입학 정원 중 무전공으로 선발한 비율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때 최상위 등급을 받은 대학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이 받을 수 있는 국고지원금의 차액은 연간 30억 원이 넘는다. 거의 모든 대학이 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 억 단위의 큰돈을 거부할 수 있는 대학이 과연 몇이나 될까. 교육부는 대학들을 자기 입맛에 맞게 굴리면서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본인들의 요구를 손쉽게 관철하려 하고 있다.
교육부가 현실을 외면한 채 25%라는 숫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의 방침이 발표된 이후 많은 대학이 인기 학과로의 학생 편중과 그에 따른 기초 학문의 붕괴를 우려했다. 대학 내 벽을 허물려다가 자칫 선택받지 못한 학과 자체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5%라는 목표와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이처럼 현장의 반발을 억누르고 추진하는 정책이 대학 내 경직된 학사 구조의 개편이라는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할지 의문이다. 진정 대학의 변화를 꾀하고자 했다면 지원금으로 대학가의 환심을 살 것이 아니라 각 대학의 사정을 고려한 무전공제 시행 방안을 내놨어야 한다.
무전공 선발을 확대해야만 지원금을 준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선발 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획으로 변경하면서 교육부가 한발 물러났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유지되는 한 대학들이 무전공제의 시행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기는 어렵다. 대학 본부가 직접 학교와 학생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육 정책에 지원금을 연계하는 방식을 재고하길 바란다.